철학에서 언급이 되는 일원론과 이원론에 대해서부터 얘기하고 시작합시다.
일원론은 자아와 세계가 하나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원론은 세계와 자아는 나눠져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양, 우리가 흔히 아는 유교적 성격에서 볼 수 있듯이 자연에 우리의 선조가 있고, 자연과 관련하여 질병을 고치는 모습으로 일원론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반대로 서양은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기반하여 이분법적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플라톤의 이데아론, 이분법적 사고는 기독교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왔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가치체계는 서양의 이원론적 시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와 세계(물질)은 개별적이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인식은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세상의 절반, 이성과 풍요와 반대되는 감정과 자연은 등한시되었습니다. 서양 철학에서 일원론에 대한 접근은 몇 몇 철학자일 뿐 주류가 된 경우가 적습니다.
어릴 적 도덕 과목의 책을 보면 공자, 붓다, 예수, 소크라테스를 신격화하는 식으로 그려진 그림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위대한 신이라는 오해를 했습니다. 적어도 공자, 소크라테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쳐도, 붓다와 예수와 같은 종교와 관련한 인물들은 진짜로 사람이 아닌 존재 쯤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가 기억하는 사료들이 신화적인 살을 붙히고는 있지만,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과 연결하여 다른 석학들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연결해봅시다.
보통? 혹은 제 개인적으로 과거의 사람들은 우리와 생각하는 것이 다른 외계인과 같은 존재로 오해를 했습니다. 다른 예시로 현대국어는 중근대 조선시대 사람들의 말하기와는 그 형태가 매우 다른 거처럼 말입니다. 혹은 완벽한 도덕 가치에 살고 있다거나, 생각이 심각하게 보수화되었거나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고, 급진적인 변화에 반감을 가지고 변화를 주도하려는 사람을 음해하려는 것.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통분모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공통분모로 서로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완전한 이해는 아니겠죠. 반대로 그들이 우리를 보면 외계인이라고 볼 겁니다. 이렇게 손가락만 움직이면 글씨가 써지고, 불이나는 네모난 뭔가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에서 당시의 과학기술이 허락하는 한 불편한 점을 개선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 책의 작가는 시리즈로 글을 씁니다. 그리고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읽기 편합니다. 넓고 얕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 책으로 이 분야를 마스터했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책과 관련된 분야에 뼈대를 세우는데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분야와 관련된 다른 책을 읽으면 더 수월하게 읽힐 겁니다. 저는 서양사, 그러니까 서양역사에 이상하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기독교 철학에 대한 반감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말한대로 준비운동은 끝냈으니 서양사와 관련한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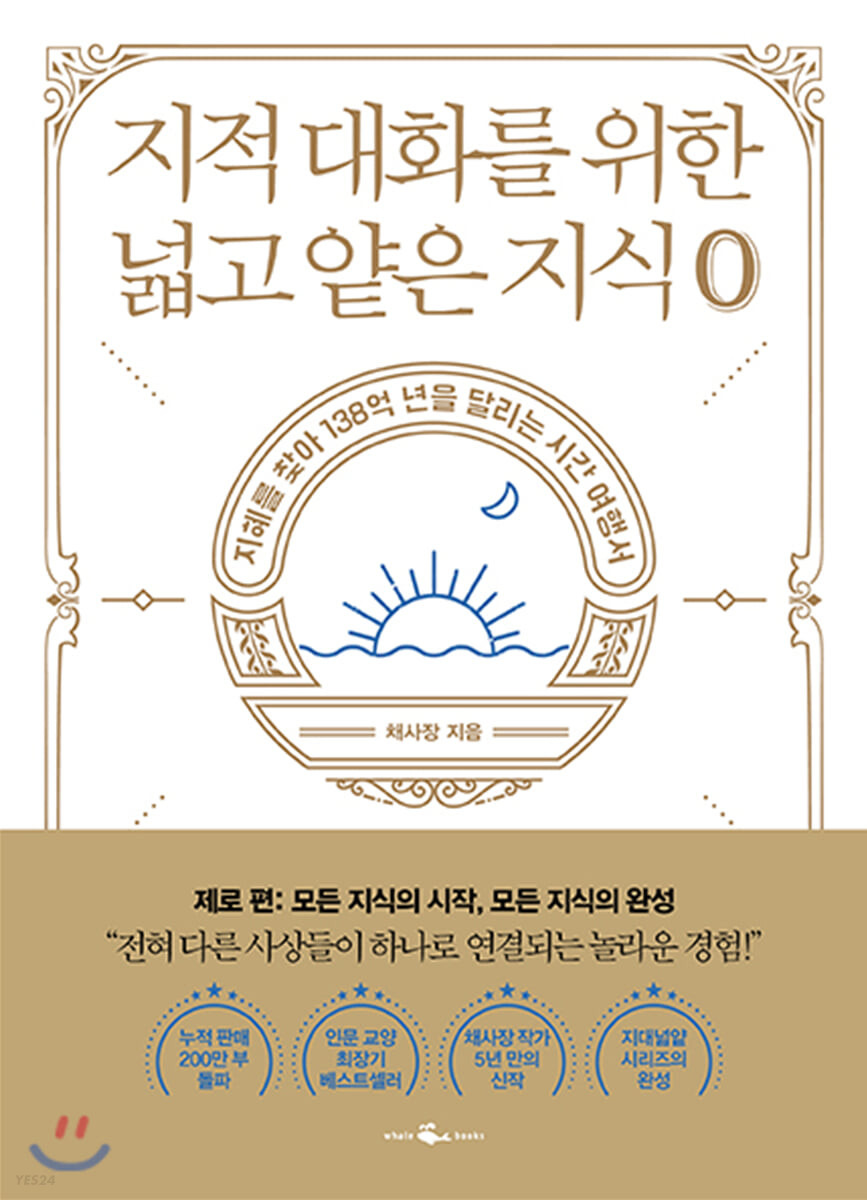
'독서 > 해상도 높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부의 본질(이윤규) (0) | 2024.12.27 |
|---|---|
|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김자룡 등) (2) | 2024.12.26 |
|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센델) (1) | 2024.12.24 |
| 이단 out (탁지일) (4) | 2024.12.12 |
| 서민 교수의 의학 세계사 (서민) (5) | 2024.12.11 |